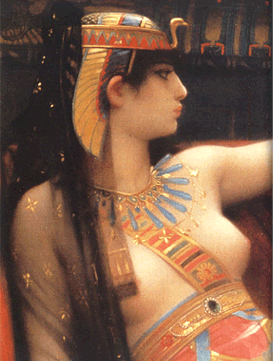|

일본 강담사 판 " 이조의 민화 " (전2권,번역소책자)
초호화 대형판 올컬러 각권 케이스입 일본소장 국보급 국내 문화재급 다량 수록
상, 하권 가로 26cm 세로 37cm 상권 274p 하권 282p 정가 4십만원 할인가 3십5만원
주문,문의 019-631-0181 할부 가

이조의민화 상권

이조의민화 하권

해설서-소책자









조선민화
조선민화와 동아시아 민화
정병모(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조선민화는 매우 한국적인 특성이 강한 그림이다. 특히 그 조형세계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와 감각이 물씬 풍긴다. 그런데 그것이 숙성된 역사적 문맥은 동아시아 보편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다. 18, 19세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일대에는 민간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이전에도 민간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신분사회로 인하여 역사의 수면 아래 침잠해 있다가 신분질서가 점차 해이해지면서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 것이다. 중국의 민간연화, 일본의 우키요에와 오츠에, 베트남의 테트화(Tet), 조선의 풍속화와 민화가 이 시기 동아시아 민간회화를 대표하는 그림들이다.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동쪽으로 갈수록 풍속화가 유행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길상화 위주의 민화가 주류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경우 동서 양 지역의 성향이 함께 나타난다. 18세기에는 풍속화가 유행하였고, 19세기에는 민화 및 길상화가 성행한 것이다.
1994년 12월, 필자는 배낭을 메고 중국의 민화인 민간연화民間年畵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국의 여러 민간연화 산지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쑤조우민속박물관蘇州民俗博物館을 방문했을 때 마당에서 어떤 이가 혁화革畵를 그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것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시골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낯익은 장면이었으며, 지금도 롯데월드박물관?용인 민속촌?강릉단오제?종로 2가 도로변 등지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혁화가 제작되는지 몰랐기에 혹시 조선족이거나 조선족에게서 배웠는지를 몇 번이고 되물은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그 해 베이징 유리창의 한 서점에서 구입한 『중국민간미술전집中國民間美術全集』을 보고 이것이 중국 고유의 것이며, 중국에서는 비백서飛白書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베이징의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중국 곳곳에서 혁화를 그려 파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가 민간미술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베트남, 일본 등의 민화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민화는 분명 우리 민족의 감성과 기지가 잘 드러난 그림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 못지 않게 문배에서 민화로 연결되는 보편성이 강한 것이 민화이다. 앞에서는 중국의 경우만 예로 들었지만 베트남의 월폐화,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와 오오츠에大津繪 등도 우리 민화와 성격이 유사하다. 민화의 예술성을 특수성이라 한다면, 민화의 기본적인 문법은 보편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민화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민화의 특수성에만 집착하여 자칫 그것이 형성된 보편성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온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문배, 세화, 그리고 민화
민화의 연원은 문배門排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배는 새해에 대문 양옆에 붙이던 그림이었다. 처음에는 악귀를 쫓는 벽사의 상징물로 붙여 가정이라는 공간을 재앙과 병마로부터 보호하려는 소망을 담아내었다.
우리나라의 문배는 신라시대 처용處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내용은 『삼국유사』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다. 신라의 헌강왕이 용을 위해 사찰을 건립하자 용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일곱 아들로 하여금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인 처용은 헌강왕을 따라 당시의 서울인 경주에 와서 아름다운 아내와 관직을 얻었다. 그런데 역신이 그만 처용의 아내를 사모하여 그녀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처용이 이를 알고도 넓은 도량으로 대하자 이에 감복하여 처용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처용 그림을 문에 붙여서 역신을 물리쳤다고 한다.
원래 문배는 당대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러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처용의 경우는 무서움이 아닌 넓은 도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처용은 자신의 부인이 겁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량으로 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설적인 대응이 역신을 쫓는 데 효과가 있었다. 『악학궤범』에 실린 처용상을 보면, 주걱턱에 주먹코로 인상이 다소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인자한 모습이다. 이는 중국 문신門神의 무섭고 사나운 표정과는 대조를 이룬다.
처용이 신라의 문배라면, 종규鐘?는 당나라의 문신이다. 표범 같은 머리에 둥근 눈을 가진 종규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무를 겸비한 재능을 지녀 장원급제하였는데, 덕종이 그를 보더니 외모를 문제 삼아 종규는 그만 화가 나서 자살하였다. 그러나 그 후 종규의 혼령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요사妖邪를 물리치니 장원관직壯元官職에 추서하고 후장하여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종규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문배로 제작되었다. 종규는 매섭고 못난 얼굴을 하여 무서움을 기조로 한 반면, 처용은 너그럽고 웃음 띤 얼굴로 인자함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처용상외에도 문배로 용호문배도龍虎門排圖를 사용하였다. 용호문배도란 대문 한쪽에 삼재三災를 쫓는 호랑이 그림, 다른 한쪽에 오복五福을 가져다주는 용그림을 붙인 그림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배그림을 점차 신선도, 화조화 등 길상의 그림이 증가하면서 세화歲畵로 발전한다. 세화는 새해를 송축하는 의미로 주고받던 그림이었다. 궁중에서는 왕이 새해에 화원들이 제작한 세화를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는 전통이 계속되었고, 서민들은 이를 본떠 세화의 풍속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벽사와 길상의 상징인 문배?세화의 기능에다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의 감계적 기능과 금강전도?소상팔경도 등 감상용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본격적인 민화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기능 및 내용의 측면에서 문배에서 세화, 그리고 민화로 연결되는 민화의 형성과정 속에는 벽사?길상?감계?감상 등의 기능이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주제의 대부분이 왕공사대부 회화에서 전래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민화에서 과연 이들 제재를 자신들의 취향에 맞추어 어떻게 변형시켰느냐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문자 같은 그림, 그림 같은 문자
문자도文字圖는 글자와 그림이 융합된 세계, 다시 말하면 형상과 내용의 독특한 결합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서화일치書畵一致의 또 다른 세계이다. 서화일치란 글씨와 그림이 각각 별도로 내용이나 형태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문자도에서는 아예 글자 안에 그림을 넣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제재 역시 원래 정통회화에서 민화로 전파된 것으로 그 연원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수壽?복福?강康?녕寧 등의 길상글자가 유행하였는데, 조선에서는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의 윤리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의 문자도를 효제도孝悌圖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어느 정도 생활 깊숙이 뿌리박힌 사상이었는지를 이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문자도를 비백서飛白書라 불렀다. 18세기 실학자 유득공柳得恭(1749-?)이 지은 『경도잡지京都雜志』 가운데 「서화書畵」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비백서는 버드나무가지를 깎아 그 끝을 갈라지게 하고 먹을 찍어 효?제?충?신?예?의?염?치 등의 글자를 쓴 것이다. 점을 찍고 선을 긋고 파임하고 삐쳐서 마음대로 물고기, 게, 세우, 제비 등의 모양을 만들었다.?
버드나무가지를 깎아 그 끝을 갈라지게 글자를 쓰면 마른 붓질하여 먹선 가운데 희끗희끗 종이가 드러나는 비백의 효과가 나니 말 그대로 비백서라는 명칭이 딱들어 맞는다. 네모난 가죽에 물감을 묻혀서 글씨를 그린 혁화革畵도 비백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비백서라 부른 것이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문자도文字圖 문자의 그림이되 비백의 효과나 가죽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붓으로 문자를 그린 것이기에 문자도라는 명칭이 합당하다.
문자도의 정형은 행서체의 글자 안에 그 글자와 관련 된 내용의 고사故事와 무늬를 채색으로 표현하여 넣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호암미술관 소장 <의자도義字圖>에는 검은 의자義字의 획 속에 의와 관련된 다채로운 도상들이 가득 차 있다. 오른쪽 중앙의 12번째 획의 적색 표지 위에는 ?백이구마伯夷 馬?라고 적혀 있어 이 글자 속의 그림이 백이숙제의 고사를 묘사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11번째 획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배치하여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에서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작품이 일본 구라시키민게칸倉敷民藝館소장 <의자도>이다. 이 글자에는 ?도원결의桃源結義?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삼국지三國志』에서 유비劉備?관우關羽?장비張飛가 도원桃園에서 결의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글자 곳곳에 복숭아꽃과 가지를 배치하여 도원임을 나타내었는데, 앞의 작품에 비하여 문양화되어 있다.
아예 글자 안을 무늬로 채운 경우도 있다. 한국 개인 소장의 <의자도>를 보면, 일정한 굵기의 선으로 윤곽을 치고 그 안을 일정한 간격의 선으로 반복하여 파도무늬를 그려 배경으로 깔고 3~6획, 7~13획 두 군데에 꽃나무 가지를 그려 넣었다. 그런데 획의 끝에는 머리초 단청처럼 무늬를 넣어 장식하였다. 아마 이 문자도는 화승畵僧이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변형은 글자 자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안의 내용만이 변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글자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도안화되고 간략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운향미술관 소장 <의자도>는 먹색의 글자 획에 꽃무늬를 배치한 형식인데, 글자의 모양이 직선과 곡선으로 도안화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며, 기하학적인 글자 속에 구상적으로 표현된 꽃무늬가 더욱 화려하게 보인다.
글자 자체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글자 안의 그림이 글자 밖으로 뛰쳐나와 글자의 획을 구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니혼민게칸日本民藝館 소장 <의자도>는 글자의 일부 획을 그림으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처음 1, 2획을 두 마리의 새가 X자형으로 어긋난 자세로 글자 위에 앉아 있고, 그 아래의 나머지 획은 초서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초서는 썼다기보다는 그렸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검고 굵은 글자와 다채로운 선묘의 새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 개인 소장의 <의자도>는 앞 작품에 비하여 그림의 비중과 내용이 늘어났다. 1~6획은 이층 누각과 두 마리의 새, 양쪽에 게양대처럼 서 있는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고 7~13획은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글자 내부에는 기물들과 무늬를 배치하고 글자의 획 사이를 성곽으로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글자를 구조물로 이용한 예라 하겠다.
글자에 비하여 그림의 비중이 늘면서 한편으로 이들 형상이 단순하게 도안화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되면서 첫눈에는 무슨 글자를 형상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작품까지 등장한다. 일본 개인 소장의 <의자도>(도 7)는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본 지붕만으로 그렸고, 글자도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정연하게 도안화하였으며, 글 사이의 성곽도 수평면으로 간략화 하였다. 이들 획 위에 앉아 있는 두 마리의 새와 양쪽의 피어난 복숭아만 구상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한자에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무슨 글자인지 눈치 채기 어렵다. 여러 작품을 통해 변해 가는 과정을 추적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문자도가 되어버렸다.
문자도 가운데 의자義字만을 한정하였지만, 우리는 이 글자만으로도 글자 안의 장식, 글자와 그림과의 결합, 글자와 상하 공간의 장식, 행서와 해서의 글자 자체 字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도안화된 새로운 자체 등 다양한 면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길상의 연못
연꽃은 그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많은 소재 중 하나다. 불교에서는 원래 더러운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에 속세에서 부처의 이상을 펼치는 상징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민화에서는 반드시 불교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연꽃의 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한줄기의 연꽃을 그리면 청렴결백하기를 바라는 ?일품청렴一品淸廉?의 의미이고, 연꽃이 무더기로 자라나 있는 그림은 개업을 축하하고 번창하기를 축원하는 ?본고기영本固枝榮?의 의미이며, 연밥이 들어 있는 꽃송이를 포함시킨 연꽃을 그리면 귀한 아들을 빨리 낳기를 기원하는 ?인하득우因何得 ?의 의미다. 또한 연꽃이 어떠한 소재와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변한다. 연꽃과 물고기가 그려지면 해마다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원하는 ?연년유여連年有餘?의 의미이고, 까치가 연밥 위에 내려앉아 연씨를 쪼아 먹는 그림은 과거시험에 잇달아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희득련과喜得連科?의 의미이며, 연꽃?백로?갈대가 어우러진 그림은 연속해서 과거에 급제하기를 축원하는 ?일로련과一路連科?의 의미다. 또 제비가 연꽃 위를 나는 그림은 천하가 태평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축원하는 ?하청해안河淸海晏?의 의미다. 이처럼 연꽃은 그 상징성이 매우 풍부하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연꽃그림을 한 병풍에 모두 담아 방에 친다면, 거주자는 다양한 길상의 연못 가운데 사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연화도가 어찌 민간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연화도의 조형세계도 역시 상징만큼이나 다채롭다. 한국 개인 소장의 <연화도>는 이 작품 자체만으로도 풍부한 조형세계를 맛볼 수 있다. 연잎이 쭉쭉 길게 뻗어 올라와 접시처럼 넓게 펼쳐진 사이에 고운 연꽃이 피어 있는 이 작품은 희고 빨간 꽃과 청록색 잎의 대비, 길쭉한 줄기와 넓적한 연잎, 그리고 몽우리 진 꽃의 조화, 여러 가지 꽃의 모양과 잎의 표현, 연잎의 양쪽이 오그라져 뒷면과 앞면이 함께 보이는 입체감 등이 어우러져 매우 다채롭다. 여기에 두 마리의 새가 연꽃에 앉아 연밥을 파먹고 있는데, 꽃 끝을 붉게 물들인 바림질의 표현이나 오그라든 잎의 뒷면과 앞면의 다른 색채, 줄기에 돋아난 솜털을 표현한 점 등은 비교적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다채로운 색채와 절묘한 구성이 돋보여, 그다지 진하지 않은 채색과 가는 필선으로 섬약한 듯하면서도 화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연화도에서도 역시 단순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연꽃과 물고기가 조합된 연화도의 정형을 따르면서도 약간 도식화가 진행된 작품으로 일본 개인 소장의 <연화도>가 있다. 누렇게 변색된 연잎과 검은색을 띤 연잎이 X자로 교차하고 있고 그 아래에 모자모양으로 엎어진 연잎을 두어 변화를 주었다. 이들 연잎 사이로 활짝 핀 연꽃과 연봉우리, 화면 아래 물 속의 두 마리 물고기가 떠다니는 모습은 앞의 작품에 비하여 간략화 되었으나 필요한 소재들만으로 한정하여 구성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조형성을 창출한 작품도 있다. 일본 마쓰코산코칸益子參考館 소장 <연화도>가 그러한 예이다. 이 작품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 개인 소장의 <연화도>와 같이 연꽃과 물고기를 조합한 구성이지만 전혀 다른 조형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위에서부터 화면 좌우로 가득 청색의 측면관 연잎?녹색의 정면관 연잎?잎맥만 표현된 측면관 연잎으로 화면의 중심을 잡고, 점선으로 묘사된 연 줄기에 의하여 형세를 잡아나갔다. 그것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미묘한 각도를 이루면서 뻗어 올라가는 형상이고, 오른쪽 아래의 빈 여백에는 수련과 연꽃을 따라 올라가려는 두 마리의 메기가 절묘한 구성 속에서 배치되어 있다. 첫 번째 작품과 같은 사실성의 차원이 아니라, 밝고 선명한 색감과 감각적인 구성 속에서 변용의 미감을 한껏 펼친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태 및 구성의 변화를 주로 살펴보았는데, 이뿐만 아니라 표현기법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개인 소장의 <연화도>는 수묵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연잎을 보면 필筆보다는 묵법墨法의 변화로써 음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잎 가운데 부분을 어둡게 나타내고 차츰 밝아지다가 윤곽부분에서 다시 어둡게 표현하였으며, 연잎의 꺾어져 보이는 뒷면도 어둡게 묘사한 음영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음영기법은 민화뿐만 아니라 전통회화를 통틀어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예라 하겠다.
반면에 일본 개인 소장의 <연화도>는 펜그림처럼 섬약한 필선을 잘 살려 표현한 작품이다. 가는 선묘에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하게 피어오르는 듯한 연 줄기들의 구성과 왼편에 솟아오른 갈대의 표현에서는 매우 감각적이고 구성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상 우리는 연화도를 통하여 형태의 변화, 표현기법의 변화, 도상의 변화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화도에 나타난 다양한 변용의 세계 속에서 민화에 나타난 상상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기하학적 구성의 세계
문자도와 더불어 문文을 숭상하는 조선인의 심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 책거리그림冊架圖이다. 이 그림에는 책꽂이가 그림의 틀을 형성하고, 그 안에는 잘 정리된 옛책과 문방구를 배치하며, 옛청동기와 같은 골동품에 길상화가 꽂거나 과일과 채소를 곁들이기도 한다. 책거리그림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의 책거리 그림은 원래 궁정에서 상?하대의 청동기류를 비롯하여 보석?사향조각?옥조각?도자기?시계?서양화폐?향수병 등을 선반에 진열하여 그린 다보격多寶格 또는 다보각多寶閣을 그린 그림에서 연원한다. 또한 중국 서북 변방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유목민족이 지방의 보물로 장식한 선반을 꾸며놓거나 이를 그림으로 그리는 풍속과도 연관이 있다.
이 책거리 화제는 조선의 궁중을 비롯한 상류계층에서 유행하던 것이 남공철南公轍의 『금릉집金陵集』에는 정조가 학문숭상의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학문에 정진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기 위해 책거리 그림을 자리 뒤에 붙여 두고 항상 감상하였다고 한다. 책가도는 정조에 의해 그 당시 궁중에 크게 유행하여 화원들이 다투어 많이 그린 장르였으며, 규장각 자비대령화원제의 8개 화과畵科 중 하나로 채택될 만큼 중요시되었다. 이규상李奎象의 『일몽고一夢稿』를 보면, 도화서圖畵署에서 제작한 책거리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도화서의 그림이 처음으로 서양나라의 사면척량四面尺量 화법을 본떴으니 그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 모든 물상이 가지런히 서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 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책거리그림冊架圖이라 하였다. 반드시 채색을 했는데, 한때 귀한 사람들 벽에 이 그림을 그려 꾸미지 않음이 없었다. 김홍도가 이 기법을 잘 했다.?
도화서 화원들이 서양화법으로 그린 책거리그림이 귀한 사람들 수요로 성행하였고, 이 그림은 김홍도가 잘 그렸다는 내용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는 이윤민李潤民(1774-1841)?이형록李亨祿(1808-?) 부자가 이 책거리그림에 능했다.
책거리그림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하나는, 면 분할이 이루어진 책장 속에 책을 비롯하여 문방구?기물 등을 배치한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책들을 바닥이나 책상?궤 등위에 쌓아놓고 그 옆에 문방구?기물 등을 배치한 형식이다. 첫째의 형식에는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둘째 형식의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보인다.
첫째 형식은 민화가 아니고 궁정회화인 이형록의 <책가도>(호암미술관 소장)로부터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몽고』에 기록된 김홍도의 작품이 발견되었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막연히 기다릴 뿐이다. 이형록의 작품은 제8폭 하단에 글씨가 정면으로 보이는 인장에 「이형록인李亨祿印」이라고 새겨진 점으로 보아 이형록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병풍은 8첩으로 중국의 다보각多寶閣과 같은 서가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무려 648권의 책이 정연하게 놓여 있어 책거리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이 그려져 있다. 책 이외에는 고동기古銅器?청나라 도자기?두루마리?문방구?대나무 찬합?향로?표주박?노리개?불수감?석류?진달래?수선화 등이 놓여 있다. 이러한 것들은 좌우동형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투시도법에 의하여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책을 쌓는 방식을 보면 정연한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약간 옆으로 밀치거나 책 사이에 간격을 두어 변화를 주었다. 다소 딱딱하기 쉬운 그림에 숨통을 틔어준 배려이다. 굵은 부재로 분할된 책장의 구성과 서양화식의 명암법으로 인하여 중후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기물들은 그릇의 돌출된 무늬나 두루마리 종이 윗면의 빛의 효과, 책에 베풀어진 음영 등을 볼 때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의 묘미를 살려 중후하면서 다채로움을, 정연하면서 변화를 꾀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양화의 투시도법과 음영법을 함께 사용한 점에서 19세기 회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형록의 책거리그림을 정형적인 작품이라 한다면, 이것의 민화적 변형세계를 맛볼 수 있는 작품으로 호암미술관 소장의 <도안문책거리>가 있다. 이 그림은 언뜻 보면 책 선반 위에 책과 기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선반의 틀은 틀대로, 책과 기물은 그것들대로 서로 관련이 없이 묘사되어 있어 선반의 틀을 그렸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이형록의 작품에서 보이는 깊이 있는 공간감이 이 작품에서는 압축되어 평면화되었으며 대신에 책투冊套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꽃무늬?나무무늬 등 여러 무늬가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어 있다. 구성적인 표현과 더불어 장식성이 강조된 것이다.
민화의 책거리그림에서는 중국이나 조선 궁중의 그림과 다른 조형세계가 펼쳐져 있다. 둘째 형식은 첫째 형식에 비하여 공간의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책의 시점과 방향의 각도를 바꾸어가면서 매우 특이한 공간감을 창출하는 작품들이 나온다. <문방구도>(개인소장)는 아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한쪽 방향으로 정연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통일되어 있고 책들도 세 무더기로 매우 정연하게 쌓여 있다. 왼쪽 아래의 무더기는 두 권의 긴 책 위에 쌓았고, 중앙의 무더기는 책상 위에 쌓았으며, 맨 위의 무더기는 탁자 위에 쌓았다. 또한 책투의 다채로운 표지색깔과 무늬가 서로 어우러져 있다.
우리 민화의 가치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특별히 책거리그림을 들어?불가사의한 조선민화朝鮮民畵?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찬탄한 작품은 니혼민케간 소장 <책거리>이다. 이 그림은 구성의 자유로운 시점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자아내었다.
다시 책거리그림에서 단순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개인 소장의 <책거리>는 간단한 구성이지만 입체 표현이 매우 독특하다. 책투의 표현을 보면, 정면을 반듯하게 배치하여 정연한 듯하다. 하지만 측면과 뒷면에 정면과 연결되는 선들이 미묘한 각도로 틀어져 있고 심지어는 옆으로 삐져나왔다. 경사의 방향이 제각각 이어서 시각적 혼돈마저 일으킨다. 그러나 오히려 정연하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입체의 표현에서 새로운 조형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이 더욱 단순화되어 추상적인 구성에까지 이른 작품이 일본 개인 소장의 <책거리>(도 20)이다. 왼쪽의 어항과 물고기와 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배치된 책투의 표현은 첫눈에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차라리 면구성이나 색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간략화되어 있다.
민화는 시각의 세계가 아니라 인식의 세계다.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관념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조형세계에는 자유자재한 상상력이 펼쳐져 있는데, 민화연구가 김철순 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인들이 그들의 꿈을 솔직하고 쉽고 간단하게 직선적으로 그려낸 것인지도 모른다.
상징과 설화의 결합
민화는 설화성이 강하다. 중국의 민간연화는 상징만으로 회화를 표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의 민화에서는 상징에 설화성을 가미하여 희화화戱畵化시키는 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민화에서는 본래 왕공사대부 설화라도 같은 소재의 서민들의 이야기로 바뀌고, 서민 취향의 형상으로 변형된다. 민화에서 즐겨 다루어지는 ?까치호랑이그림鵲虎圖?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원래 호랑이그림에는 까치가 나오지 않으며, 맹호도라 하여 호랑이가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상례이다.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리고 강세황이 소나무를 그린 <송하맹호도>(호암미술관 소장)를 보면, 꼬리를 곧추 세우고 등을 올린 채 얼굴을 가만히 돌려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무언가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모습이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호랑이 터럭도 결을 따라 세필로 정성껏 묘사하여 사실주의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이 그림에는 소나무는 있지만 까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정통회화의 맹호도이다.
그런데 민화에서는 까치가 등장한다. 여기서 까치는 서민들의 신분에 대한 불만을 카타르시스 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까치는 힘없는 서민을 대표하고 호랑이는 권력을 빙자하여 폭정을 자행하는 관리를 상징한다. 실제 당시 서민들 사이에는 까치호랑이의 설화가 유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까치가 지혜로 힘센 호랑이를 골탕 먹임으로써 신분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억울함과 푸대접을 항변하는 것이다. 민화의 호랑이는 일반회화의 호랑이와는 전혀 딴판으로 변용되었다. 그리하여 더러는 그 사나운 맹호가 얼빠지고 우스꽝스러운 ?바보호랑이?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호랑이의 형상도 엉뚱하고 기발하게 묘사된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얼굴은 얼굴대로 몸은 몸대로 각기 다른 시점을 적용하여 조합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또한 88올림픽 마스코트가 된 호랑이그림은 무늬처럼 도안화되기도 한다. 일반 호랑이그림은 그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지만, 서민들은 호랑이라는 소재만 빌려왔을 뿐 그것에 담긴 설화는 전혀 다르고 그 형상 또한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다.
호암미술관 소장 <까치호랑이>(도 28)를 보면, 구부러진 소나무 밑에 호랑이가 앉아 있고, 소나무에는 까치 두 마리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아무리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보여도 나뭇가지 위에 앉은 까치는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다. 민초와 같이 힘없는 계층을 대변하는 까치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탐관오리와 같은 호랑이를 통쾌하게 농락 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 그림에서는 호랑이의 얼굴을 크게 강조하고, 불을 킨 듯한 눈과 날카로운 이빨에 부처님의 백호처럼 이미 한가운데 흰 터럭이 나서 백수의 왕임을 상징하고 있다.
외모에는 용맹스러움이 넘치지만 까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호랑이는 그 자체로도 고양이, 살쾡이 등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벽사의 화신답지 않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바보처럼 얼빠진 모습으로 그려진 작품에서 공포와 무서움으로 귀신을 퇴치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운향미술관 소장 <까치호랑이>는 아예 고양이로 거세된 경우에 해당한다. 노랗게 불을 킨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는 여전히 번득이지만 이미 머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인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호랑이를 우리는 애칭으로 ?바보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은 등줄기의 표현이다. 오른쪽은 옆모습을 보여주지만, 왼쪽은 정면의 모습이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시점이 등에서 이원화되어 있다.
고양이로 변신한 <까치호랑이>(경희대박물관 소장) 한 점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이 호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여기서는 도안식으로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호랑이도 꼬리를 추켜올린 자세에 줄무늬를 그려 넣었지만 위의 그림처럼 터럭을 하나하나 그려 넣지 않았다. 또한 얼굴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콧날을 중심으로 좌우 얼굴의 시점이 앞 작품의 등줄기처럼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호랑이와 까치는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신재현申在鉉이 갑술년甲戌年 설날 아침에 그린 <까치호랑이>(호암미술관 소장)의 제발에서는 ?호랑이가 남산에서 부르짖으니 까치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虎嘯南山, 群鵲都會?라고 적혀 있다. 이 그림에서 호랑이와 까치의 관계는 사이좋게 보인다. 아울러 손자 호랑이들이 할아버지 호랑이의 곁에서 놀고 있으니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호랑이를 비롯하여 새끼호랑이, 까치, 소나무, 불노초 등이 평면 속에서 배치되어 있는데, 전혀 깊이감이 배제되고 다만 크기로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호랑이의 줄무늬, 소나무의 껍질, 불로초 등이 패턴화된 무늬로 표현되어 장식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무늬에서도 역시 중심이 되는 호랑이의 줄무늬는 크고 강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세밀하게 묘사하여 구분하였다.
하모니즘
민화에서는 장르와 장르, 물상과 물상 등 그 관계의 설정에서도 매우 자유롭다. 화조도에 갑자기 고사인물화가 등장하거나 백동자도에 책거리그림이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민화가들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형상을 넘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르와 장르의 결합을 시도하고, 물상간의 관계도 새롭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화 속에 표현된 변용의 세계의 또 다른 깊이를 느끼게 된다.
고사인물화와 화조화가 조합된 경우로 한국 개인 소장의 <행락도行樂圖>를 들 수 있다. 화면 위에는 네 명의 여인들이 버드나무에 매단 그네를 즐기고 있고, 그 아래에는 급격히 작아진 집들이 놓여 있다. 아마 춘향전의 한 장면을 묘사한 듯하다. 그런데 화면 아래에는 갑자기 커진 모란꽃이 활짝 피어 있어 스케일에 있어서 혼란이 온다. 모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그네 타는 장면이고, 가장 작은 것이 이들이 사는 동네이다. 중요도에 따라 스케일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분의 상승을 꿈꾸는 춘향이의 설화와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대등하게 배정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 개인 소장의 <극락도極樂圖>도 앞의 작품처럼 고사인물화와 화조화가 결합된 작품이다. 우선 화면 위에 바람에 휘날리는 버드나무를 화면 가득히 배치하고 그 위에 새들이 날아와 앉는 모습을 그렸다. 버드나무에 제비가 날아와 앉는 장면은 과거 급제하여 축하연을 베푸는 ?도류사연桃柳賜宴?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버드나무 오른쪽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피어 있다. 화면 아래에는 산 속에서 네 명의 신선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바둑을 즐기면서 숨어사는 모습을 그린 상산사호商山四皓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사실 이들 장면들은 내용상 서로 연결하기 어려운 주제들인데도 민화가들은 거리낌 없이 조합해 놓았다. 전혀 엉뚱한 듯한 장르의 결합, 여기서도 민화가들의 자유자재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일반회화 속의 물상과 물상의 관계는 대부분 매우 유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자연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이다. 그러나 민화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관계가 새롭고 인위적으로 재창조된다. 금강산도를 보면 그러한 관계 설정이 적지 않게 흥미롭다.
금강산도하면 18세기에 활동한 정선鄭敾이 대표적인 화가이다. 금강산도는 그에 의하여 전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선의 <금강산도>(호암미술관 소장)는 부드러운 미점(米點)의 토산과 날카로운 수직준의 암산이 마치 태극도太極圖처럼 음양의 원리에 의하여 상대화합되어 있는 천하의 형상으로, 다른 화가의 금강산도에 비하여 경물들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민화에서는 금강산에 대하여 이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특히 에밀레박물관 소장 <금강산도>는 정선의 금강산도와 정반대의 인식이 보여 일반화가와 민화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금강산의 전경을 봉우리별로 나누어 균등하게 분리하였다. 정선과 같이 응집된 구조가 아니라 나열식의 구조인 것이다. 정선은 잘 알려져 있듯이 금강산을 실제 답사하고 그린 것이지만, 그 그림 또한 자신의 인식 틀 속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에밀레박물관본을 그린 민화가는 금강산을 가보지 않고 귀로만 들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일만 이천 봉우리를 그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실제적인 측면보다 개념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민화가는 서민들의 성지인 금강산을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로서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화된 변형이 민화의 중요한 특징임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는데, <책거리>(일본 개인 소장)처럼 변형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철산읍 풍경을 그린 <철산읍지도>(호암미술관 소장)를 보면 산의 모습은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간략화되고 추상화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표현하였다. 구상과 추상의 결합, 이것은 민화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이다. 이러한 구성은 최근 김흥수 화백에 의하여 주창되고 있는 하모니즘Harmonism을 연상케 한다.
조선민화를 세계로
나는 조선민화를 세계올림픽에 내보내기 위해 훈련시키는 국가대표감이다. 물론 올림픽종목에는 조선민화가 없고, 대한체육회에서 나를 감독으로 임명한 사실도 없다. 하지만 조선민화가 우리나라 미술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장르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미술을 세계화해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국가대표감독을 자처한 것이다. 중국은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하여 도자기가 영어로 'china', 즉 진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일본은 서민회화인 우키요에를 유럽과 미국의 문화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애석하게도 우리의 전통미술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다. 물론 소수의 애호가들이 관심을 쏟은 경우는 있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때문에 전통미술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을 외국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 조선민화라 생각한다. 조선민화를 대표 감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조선민화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미학자 柳宗悅은 민화 책거리를 보고 “불가사의한 조선민화”라고 극찬하였다. 2001년 프랑스 기메박물관에서 개최된 민화전시회인 “Nostalgies coreennes”는 유럽 문화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민화가 외국인 관심을 갖고 선호하는 그림임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들이다.
둘째, 조선민화는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이다. 현대의 한국화가치고 민화에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지금도 미술대학교 학생들은 민화도록을 보고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고, 지금도 현대 화가들의 전시회에 대한 평 중에서 민화를 현대화하였다는 구절이 종종 눈에 띈다. 민화는 한국적인 맛이 풍부하면서도 자유롭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인하여 많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몇몇 화가들은 아예 작품을 위해 민화를 수집하다가 민화의 유명한 컬렉터로 알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민화의 작품성이 독특하고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셋째, 조선민화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중문화라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화에 유리하다. 현재 아시아에 유행하고 있는 한류는 우리의 대중문화이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문화계에 영향을 준 일본문화의 열풍, 즉 Japonism의 중심에는 일본의 서민회화인 우키요에가 자리 잡고 있다. 조선민화도 감성에 직접 호소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고급문화보다 세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아시아 민화 가운데 일본의 우키요에는 세계인의 사랑받는 회화가 되었다.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가 파리시절 자신의 아틀리에서 우키요에를 붙여놓고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미국의 박물관치고 우키요에를 소장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때문에 영어로 쓰인 책으로도 "Japanese Art"보다 "Japanese Prints(Ukiyoe)“가 더 많이 출판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문화상품들을 보면, 우키요에의 미인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동아시아 민화들 가운데 우키요에와 더불어 세계시장에 내놓을만한 것은 조선민화라 생각한다. 중국의 민간연화나 베트남의 테트화는 민속학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상이지 작품적인 매력은 조선민화에 훨씬 못 미친다. 그만큼 조선민화는 그 조형세계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 읽어 볼만한 책
이우환, 『이조의 민화』, 열화당, 1979
김철순, 『한국의 미-풍속화』19,중앙일보사, 1985
김철순, 『한국민화논고』, 예경, 1995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8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할미디어, 2001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9
| A : 회화가 머에요? |
| 답변자 : prijia1 l 2006-01-25 01:48 작성 |
태클달기 l 신고하기 | |
색과 선을 사용하여 평면 위에 어떤 형태를 단독 또는 다양한 결합으로 나타낸 조형예술. 원뜻은 <색을 칠하다>라는 것이지만,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 선의 묘사나 동양의 수묵화·판화 등도 포함한다. 3차원 공간에 표현하는 조각이나 건축과는 달리 2차원 표면상에 표현하여 시각형상을 그려낸다. 평면적 통일과 좌우대칭성, 수직·수평의 안정감을 강조하는데, 추상적 형태로 장식하거나 인간생활에 관계된 구체적 형상을 그려 넣어 작품을 창출해 낸다. 재료나 소재, 표현방법, 주제나 기법 등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으며 시대나 계통, 문화권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재료에 따라 수채화·유화·템페라화·모자이크·파스텔화·묵화 등으로 나뉘며 주제에 따라 종교화·역사화·풍경화·인물화·산수화·정물화 등으로 구분된다. 또 형식에 따라 캔버스화·병풍화·벽화·세밀화 등으로, 표현방법에서는 구상화와 추상화로 구별된다. 이 밖에 장식화·사생화·우의화(寓意畵)·풍자화 등 표현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서양회화와 동양회화로 나뉜다. 서양회화
석기시대 회화유물이 그 시초로 추정되는데,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작품은 프랑스 남중부 라스코동굴과 에스파냐 북부 알타미라동굴의 구석기시대 동굴벽화이다. 그 뒤 BC 3000년 무렵 이집트·메소포타미아문명에서 번성하여 후기 에게문명과 그리스·로마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서양회화 개념은 프랑스어 타블로의 뜻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본래 판화(板畵)를 가리키며 고대 후기 미라초상화까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미술을 계승한 로마는 그레코로만 양식을 낳았으나, 5세기 무렵에는 형태의 아름다움보다 내적표현에 중점을 두는 그리스도교미술이 주류를 이루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시대 비잔틴미술에서 회화는 종교와 결부된 이콘(Icon;聖像)으로 발달, 성당을 중심으로 모자이크화·프레스코화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베네치아와 남부이탈리아·시칠리아·불가리아·러시아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성화상 논쟁 및 성상파괴운동으로 르네상스 초기 비잔틴회화는 이슬람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림양식으로 바뀌고, 보다 인간적이고 자유분방한 소재로 전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중세 초기 회화는 각종 벽화 및 채식사본(彩飾寫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미니아튀르라 하였는데 사본의 작은 삽화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세밀화(細密畵)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11∼12세기에는 카롤링거왕조와 오스만제국 전통을 따른 로마네스크 양식의 프레스코화·템페라화가 융성하여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회화로 이어졌고 북유럽에서는 고딕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전반적으로 평면적·직선적이며 중량감 없이 고도로 양식화된 로마네스크회화와 벽화 대신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에 문양과 색체계를 표현하여 서정적 세련미를 추구한 고딕회화가 그 뒤를 이어 낭만적 삽화의 등장을 자극하였다. 12세기 이탈리아회화는 안테펜디움(antependium;제단 앞 장식)이나 레타벨(retabel;제단 뒤의 가리개)과 같은 제단화(祭壇畵)가 융성하였으며, 르네상스기 북유럽에서도 발전하였다. 15∼16세기 르네상스기에는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근대적 회화가 크게 번성하였다. 이 시기 회화의 특징은 공간에 대한 기하학적 법칙성 해명, 인체의 해부학적 연구, 빛과 명암의 과학성 추구, 고대작품 연구, 묘사대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 등을 들 수 있다. 원근법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회화에 조각과 같은 균형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고전적 조각과 부조에 가까운 경향이 나타나 예전의 부자유스러움과 대조되는 편하고 우아한 조화를 낳았다. 대표적인 화가로 P. 우첼로, 조반니,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S.U. 라파엘로 등이 있다. 또한 이전의 거친 템페라화법에 비해 투명도와 광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유화화법이 일반에 보급, 점차 회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착되어 갔다. 반 에이크형제의 《겐트의 제단화》는 종교적 인물이나 정경을 그리면서 유화의 특질을 잘 발휘한 작품으로 이후 인물화·풍경화·실내화·정물화로 분화되어가는 근대회화의 요소들을 잘 배합하고 있다. 17세기 바로크시대에는 캔버스에 유채로 그리는 전시기 타블로의 장르가 더욱 발전하는 한편 르네상스 회화의 수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공간표현을 이루었다. 특히 색채표현과 형상의 감각적 재질묘사는 플랑드르지방을 중심으로 융성하였는데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실내화·정물화·풍경화에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재질묘사가 추진되었다. 절대왕정시대부터 프랑스대혁명을 거쳐 나폴레옹 집권기에 이르는 시기는 이른바 그랑팡튀르(大繪畵)의 시대로 고전주의와 대립된 낭만파회화도 포함하여 역사화나 우의화(寓意畵)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18세기 이후에는 회화의 중심이 프랑스로 옮겨졌다. J.B.S. 샤르댕은 물체가 단일한 빛의 반영이 아니라 물체 사이 빛의 교류에 상호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낭만파에 이어서 사실주의를 제창한 G. 쿠르베, 자연광(自然光)에 주목한 E. 마네를 거쳐 인상파 미학의 중심을 이루는 외광(外光)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켰다. 19세기 후반기 인상파 이후에는 야수파·입체파·초현실주의·표현주의 그리고 전위파에 이르기까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표현양식이 나타났다. 제2차세계대전중 많은 유럽 화가들이 뉴욕으로 건너가 미국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뉴욕은 현대회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표현하는 행위자체를 중시, 회화에 적용한 액션페인팅이라는 추상표현주의 경향이 대두하였는데 그 대표자인 J. 폴록은 스스로 화면(畵面) 속에 들어가 물감을 떨어뜨리는 방법(dripping paint)을 쓰기도 하였다. 1950년대초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팝아트가 나타나, 흔히 발견되는 일상의 이미지나 물체를 작품화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상징성에 반동하는 추상회화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미니멀아트 경향도 젊은 작가들에 의해 추구되었다. 이 시기 일상적 현실을 극히 생생하고 완벽하게 묘사하는 극사실주의가 일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시도되었으며, 20세기초의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에서 파생된 경향인 움직임을 중시하는 키네틱아트도 황금기를 이루었다. 독일의 O. 피네·H. 마크 등의 <제로그룹>은 새로운 소재와 자연과 인공의 빛을 이용한 방법을 추구하였으며, 프랑스에서도 운동과 빛에 의한 조형을 추구하는 키네틱 작가들이 <시각예술탐구그룹>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빛·소리·움직임으로 대변되던 키네틱아트는 급속히 쇠퇴, 물·안개·불 등 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생태학적 방법론의 방향으로 그 경향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재발견을 통한 비디오아트·레이저아트·홀로그래피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작품도 나타났다. 키네틱아트가 변화·발전한 형태의 테크놀로지아트는 기술적으로 보다 단순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 많다. 오늘날의 회화는 종래의 회화에 대한 비판·수정·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며, 점차 과학기술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동양회화
인간을 중심에 두고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서양회화와는 달리 동양회화는 자연을 중심으로 작가의 주관을 개입시켜 대상을 이상화(理想化), 미화(美化)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한자(漢字)문화권을 배경으로 형성된 중국·한국·일본의 회화와 인도의 회화의 2가지 흐름이 있다. 중국·한국·일본 등에서는 화(畵)·도(圖)·도화(圖畵)·서화(書畵) 등으로 불리다가, 19세기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채색을 뜻하는 회(繪)와 선묘를 의미하는 화(畵)가 합쳐져 회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재료기법에 따라 수묵화·채색화·담채화, 화법에 따라 남종화·북종화, 용도에 따라 일반화·기록화·불화(佛畵)·민화(民畵) 등으로 나뉜다. 시대와 그림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구사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단이나 종이에 모필과 먹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작품은 벽화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긴 두루마리[卷(권)], 상하로 긴 축(軸), 앨범모양의 첩(帖), 부채꼴모양의 선면(扇面), 병풍 등과 같은 화면 형식을 통해 다루어졌으며 작품이 완성되면 작가의 이름이나 호를 서명하고 낙관을 하였으며 그림의 제목, 제작동기와 경위, 심정, 장소, 기일 등과 작품에 대한 평까지도 함께 기록하는 독특한 형식을 이룩하였다. 의식에 내재하는 형상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경향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적인 것에서 초탈, 상상의 미를 표출함으로써 함축적이고 절제된 묘사와 여백을 통한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특히 수묵화에서 보이는 절제된 표현은 동양적 사상과 여백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대한 자연의 힘을 강조하고 자연에 귀의하려는 자연주의적 특성과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풍경화와 산수화는 오래전부터 발달하였는데 산수화는 위대한 자연의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 대표적인 회화형태로 자리하였다. 중국의 경우 방대한 영토와 역사만큼이나 양식의 형태와 변천 또한 다양하다. 한(漢)나라를 전후하여 인물화 중심의 고대회화가 발전해 왔는데, 선사시대 유적과 갑골문자 등 상형문자를 통해 이미 회화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뒤 위진(魏晉)시대에는 분묘의 장식이나 부장품으로써 실용적인 회화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신화와 전설 또는 죽은 뒤의 세계를 묘사하다가 나중에는 죽은 이의 생전 생활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조형예술로서의 글씨와 그림이 형성되었는데 5세기초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는 고개지(顧愷之)의 《여사잠도(女史箴圖)》는 당시 회화 전통을 집약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남북조시대를 거쳐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불교문화 번영과 서방예술 유입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철학적 이상세계를 묘사한 불교작품과 자연을 담은 산수화,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회화작품들이 제작되었다. 당나라 후기부터는 궁정이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수묵화를 비롯한 각종 화법이 형성되었는데, 주(周)나라로부터 시작된 한림도화원(翰林圖畵院) 등 화원제도의 운영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송(宋)나라에 들어서는 수많은 화가들이 배출되었으며, 비(非)직업화가들에 의한 문인화 부문에서도 융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산수화는 전형적 모습과 높은 품격을 이룩하였는데, 북송시대 체계화되었던 문인화 개념이 원(元)나라에 이르러 남종문인화풍으로 완성되고, 관념적·환상적인 자연 경치의 재현이라는 추상적 형태는 명(明)나라 이후 중국회화는 물론 한국·일본 등 동양회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회화는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중국·한국 등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섬나라라는 격리성에서 비롯된 그들 고유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정신적·철학적 측면보다 시각적 효과에 치중, 산수화보다는 인물화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불교 전래 이전 고분벽화나 토기·토우(土偶) 등의 원시적 작품 속에서 그 회화적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6∼7세기 아스카[飛鳥(비조)]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 불교를 수용, 이를 기반으로 회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8세기 나라[奈良(나량)]시대에 이르러서는 서역·이란 등의 화법도 전래되었으며 특히 중국 문물·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미술도 당풍(唐風)이라는 큰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 그 뒤 헤이안[平安(평안)]시대에는 불교회화와 야마토에[大和繪(대화회)]라 일컫는 일본화한 양식이 나타났으며 가마쿠라[鎌倉(겸창)]·무로마치[室町(실정)]시대 등을 거쳐 쇄국과 개국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방과 변형 속에서 일본 고유의 회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헤이안시대부터 진척되어 가마쿠라시대까지 계속되어온 고유 색채를 드러내는 경향의 국풍화(國風化)가 대표적이다. 근세에 들어서는 동양 수묵화에 서양의 정교한 사실적 기법을 접합시킨 화풍이 유행하였다. 일본회화는 중국·한국의 회화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이를 모방, 발전시켜 고유의 형식을 창조해 나갔는데 디자인적 구성, 평면성, 채색미나 감각 등을 중시하여 표현주의적 측면이 강조되는 화풍을 형성하였다. 한편 동양회화의 또다른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인도 회화는 종교·철학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끊임없이 외래미술이 유입되었으며 이를 적절히 수용, 자신들의 전통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광대한 영토와 역사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통일성을 갖춘 고유의 회화를 창출하였다. 힌두교·불교·자이나교·조로아스터교 등 다원적 종교미술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한 종교성과 특유의 관능성(官能性)을 띠고 있다. 고대에는 불교미술이 주류를 이루어,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아잔타석굴 벽화에서 인도회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한 색채와 형이상학적·우주적 신비를 간직한 교리 그리고 성적(性的) 숭배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민간신앙과 혼합을 이룬 성속일체(聖俗一體)의 양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도회화는 주제는 종교적이나 실제는 인간중심적 정신에 따라 현실적 삶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이 중국 중심의 대륙 회화의 흐름과 대비되는 인도적인 특징이다. 고대에는 벽화나 작은 규모의 세밀화가 그려졌으며 12세기 이슬람미술이 도입된 이후에는 전통미술과 이슬람미술의 융합, 페르시아를 통한 중국회화 전래 등으로 다양한 양식의 회화가 발전하였다. 서민적인 색채를 띠고 힌두교신화를 주제로 한 라지푸트회화와, 세밀화에 속하면서 공간구성이나 표현·주제 등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무굴회화가 이슬람 궁정미술로 발전해 나갔다. 17∼18세기에는 인도 고유 회화 전통에 바탕을 둔 독특한 양식의 채색화로 색채구성이나 감정표현에서 강렬함을 나타내는 라자스탄회화와 파하리회화, 그리고 곡선적이며 온화하고 서정성 넘치는 색채의 캉그라양식 등이 발전하였다. 19세기 이후 영국 지배 아래 전통회화의 쇠퇴로 R. 타고르 등을 중심으로 한 벵골화파의 전통회화 복귀운동이 이루어져 현대회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도회화는 동양회화의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면서 동남아시아 회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회화
선사시대 바위 그림이나 선각화(線刻畵) 등 주술성이 강한 단계를 거쳐 삼국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발전을 거듭해 왔다. 중국을 비롯한 외래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양식을 발달시켰으며, 일본회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삼국시대 고대회화는 주로 고분벽화를 통해 보여지는데 고구려의 힘차고 율동적인 모습과 백제의 부드럽고 온화함이 넘치는 세련된 표현, 그리고 신라의 다소 사변적인 묘사는 삼국이 상호교류하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양식을 이루어 나갔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불교가 회화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후 도교적 영향이 가미되면서 통일신라와 고려에까지 이어졌다. 통일신라 때는 불교회화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인물화와 함께 사실적이면서도 힘찬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畵)도 발전하였다. 고려시대 회화는 소재·기능·작가계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교·불교·도교 3교에 기반한 문풍(文風)을 진작시킴으로써 종교화는 물론 일반회화도 전개되었으며 문신 귀족체제에 힘입어 문인화가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도화원(圖畵院)이 설치되고 실경(實景)산수화 전통이 형성되었으며 수묵풍 이상산수와 선승화가(禪僧畵家)들의 수묵선종화도 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회화가 가장 발달한 조선시대는 회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양식의 다양화로 문인화·풍속화·민화 등 일반회화가 풍성하게 제작되었는데, 초기에 형성된 한국화풍의 전통이 명(明)·청(淸)나라 화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나갔다. 후기로 갈수록 고전적 이상경(理想景)을 소재로 한 정형산수화가 실제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 진경산수화로 점차 변모해 갔으며, 김홍도(金弘道)·김득신(金得臣)·신윤복(申潤福) 등의 풍속화와 여항화가들의 민화 등이 발달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개성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19세기말 개항기에 도입·전개된 원근법·음영법과 같은 서양화풍은 전통회화와 구분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60∼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화단을 형성하며 한국회화를 주도해 왔다. 전통회화는 서양화의 영향으로 1930년대 이후 동양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일제시기와 분단을 거치면서 다소 침체상태에 있었으나, 1970∼1980년대 한국회화의 주체성과 국제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한국화라는 이름을 되찾아 그 질적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
관광-리비아
몰타와 리비아가 합작하여 투자한 CORINTHIA 호텔이 완공되면서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유적지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으며,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사막 관광은 장관으로 기회가 있을 때 꼭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으나, 최소한 5박 정도를 계획해야 제대로 사막을 구경할 수 있다.
트리폴리 동쪽 120KM 지점의 해안에 위치한 '렙티스 마그나'는 북아프리카 최대의 로마 유적지로 유명하다. 모래에 파묻힌 이 거대 고대 도시는 한 번쯤 둘러 볼 만한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트리폴리 서쪽 60KM 지점에 위치한 사브라타는 로마 원형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벵가지 동북쪽 219KM 지점에 있는 Cyrene은 고대그리스 로마 유적지로 기독교 사도인 마가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벵가지 동북쪽 235KM지점의 Apollonia는 클레오파트라의 욕탕으로 유명하며, 벵가지 동북쪽 110KM 지점에 위치한 Tolmeita(Ptolemais)도 잘 알려진 고대그리스 유적지다.
트리폴리에서부터 서남쪽 400KM 지점 GADAMES까지의 사막길 드라이브 코스와, 트리폴리 남쪽 1,300KM 지점 사하라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AKAKUS는12천 년 전 원시 거주인들의 벽화로 유명하다.
관광시 유의사항
리비아는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호텔 요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 출장 시에는 달러를 여유 있게 준비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저한 아랍어 공용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리비아인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므로 비상시를 대비해, 유용한 아랍어를 메모해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촬영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비아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민감한 정치 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
리비아의 역사는 이슬람 이전 시대와, 아랍화 이행기, 이태리 식민지 시대, 근대독립 국가 시대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근대독립국가는 1969년 현혁명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고대 리비아에는 LIBYAN과 ETHIOPIAN의 두 종족이 있었으며, 전자는 주로 지중해 연안 지대에 후자는 주로 내륙지대에 거주했다. BC 1,000년경부터 PHOENICIAN인들이 항해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트리폴리 지역에 LEPTIS라는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이는 보다 확대되어 BC 517년 CARTHAGE로 발전되어 오늘날 리비아의 전신이 되었다.
CARTHAGE 후반기에는 로마와 쟁탈전 와중에서 북서부 지역이 NUMIDIAN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고, 이는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 AFRICA NOVA주가 창설될 때까지 계속된다.
BC 600년경 그리스는 동북부 지역을 식민지화하여 후일 알렉산더에 의해 복속된 강력한 도시 국가인 CYRENE이 만들어져 BC322년 PTOLEMIES, BC 96년 다시 로마의 통치로 이어진다.
로마시대의 번영이 계속되다가 AD 세기 중반 쇠퇴기에 접어들어 AD 431년 GENSERIC의 VANDALS에 의해 정복되었다. 수 백년 후 다시 JUSTNIAN'S 황제시대 BELISARIUS 총독에 의해 재 정복되어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오랜 외세의 침입 과정에서도 계속된 원주민(베르베르족)의 항쟁이 결실을 맺어 마침내 자체 군주국가를 창설하게 되나, 아랍족의 침략이 재개되어 AD 643년 트리폴리가 점령되었다. 때로 스페인 등 크리스찬 세력의 침입이 있기도 했으나, KALIF OF BAGHDAD에서부터 오스만 터키를 거치면서 완전한 아랍화가 이루어졌다.
1911년 9월29일 이태리가 해적행위를 이유로 터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912년 마침내 트리폴리를 점령함으로써 2차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이태리 식민지 시대를 거치게 된다.
2차대전의 결과, 1942년 프랑스군이 남부 사막지대(FEZZAN)를, 나머지를 영국군이 점령했으며, 1952년 UN이 독립을 인정할 때까지 상당한 근대적 경제기반이 마련되었다.
UN이 독립을 인정하기 전 1951년 11월 독립을 선언하면서 창설된 연방군주국 시대가 열렸고, 50년대 중반 석유개발은 리비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모 시켰으나, 정정불안이 계속되었다.
왕정의 친 서방 정책과 석유개발 이권의 양도에 반발하여, 1969년 9월 1일 현 카다피 혁명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장교단이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무혈혁명에 성공하여 리비아 아랍 공화국을 수립했다.
혁명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기 시작, 석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반 산업시설의 국유화가 추진되었으며, 1977년에는 공식국명을 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로 개칭하며, 제3세계 이론에 의거한 '국민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목표로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
 7월16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오른쪽)과 사우디아라비아 탈랄 왕자가 루브르 미술관에 들어설 이슬람 미술관 착공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AP연합,관람객들이 전을 감상하고 있다.©EPA
7월16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오른쪽)과 사우디아라비아 탈랄 왕자가 루브르 미술관에 들어설 이슬람 미술관 착공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AP연합,관람객들이 전을 감상하고 있다.©EPA
 가
가 |
|